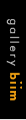EXHIBITIONS - 갤러리 빔의 다양한 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Category | Title | Date |
|---|---|---|
| 일반 | 전시 시작합니다.(한영권展) | 2025-05-17~2025-05-17 |

안녕하세요!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감이 함께 하는 12월,
갤러리 빔의 2009년 마지막전시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방문을 고대합니다.
-------------------------------------
전 시 명 : Faint memory
작 가 명 : 한 영 권
전시기간 : 2009. 12. 14. - 27.
전 시 장 : 갤러리 빔 (02 723 8574, www.biim.net)
전시내용 : 설치
작가노트 :
- 이번 작업은 대리석과 삼겹살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의 만남으로
표면 이미지가 유사한 재료들의 만남이다.
그 이미지 중 하나는 건축의 재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음식의 재료이다.
작가의 표현으로는 대리석과 삼겹살의 시각적 표면 이미지가 비슷하며,
대리석의 영어명인 마블과 삼겹살의 구조를 일컫는 마블링의 상관관계가
작업의 모티브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와 작업 계획안으로 작성된 전시장의 바닥면에
붉은 생 삼겹살이 확대된 이미지가 합성된 자료를 보고 연상한 광경이며 소감이니
실제 전시된 이미지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리석은 서구의 건축사와 관련해 건축의 주요 재료 중 하나였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량 분포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서구 고건축의 주재료가 대리석이었다.
대리석은 석회암의 변성암이라, 물리적인 경도가 무르고 약해서 다양한 색채를 띄운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으로 큰 부피의 조각으로 떼어내는데 용이하고,
또한 연질이라서 다듬기도 편리하고, 표면 질감도 매끄럽다.
그래서 흰색의 대리석을 활용하여 대형 건축물과 조각물들을 만들어왔으며,
요즘에도 건축물의 마감재로 활용된다.
삼겹살은 돼지의 일부 조직으로 기름 층과 고기 층이 세 겹으로 이루어진 부위인데,
뻑뻑한 고기 사이에 기름 층이 자연적으로 브랜딩 된 부위이다.
삼겹살이란 음식의 재료이기도 하며, 개별 음식이기도하다.
그러나 삼겹살은 완결된 음식으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날것의 재료 그대로가 손님에게 제공되고, 이후 불에 굽거나 익혀서 음식으로 완성된다.
적절한 온도로 가열된 고기판 위에서 얇은 조각으로 수평으로 뉘어져 지글거리며
기름과 수분을 뱉어 내며, 뱉어낸 만큼 수축되며 흰색으로 익혀지는 삼겹살,
완성되는 순간 돼지의 일부인 다 익은 삼겹살은
음식이나 안주로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얼핏, 대리석과 삼겹살의 만남은
물리적 특성이나 문화사적인 맥락상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나,
작가는 붉은색 대리석과 생삼겹살의 표면 이미지에서 유사성을 찾았다.
두 이미지의 유사성은 흰색 석회암질에 철 성분이 섞여
울긋불긋한 대리석의 이미지와, 흰색의 지방층과 붉은 육질이
일정한 방식으로 교차된 삼겹살 이미지를 공통분모로 만난다.
전시공간의 바닥면에 삼겹살이 확대된 이미지가 합성된 계획안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스친 감각은 울렁거림이었다.
날 색으로 프린트된 돼지고기의 붉은색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당혹감을 느끼게 했고,
이어서 실제의 삼겹살이 깔린 구간을 밟고 지난다는 상상을 해보니,
물컹거리는 바닥으로 인해,
신체의 신경들이 그 바닥에 집중하며 균형유지에 전념해야하는,
이런 낯설며 상쾌하지 않은 간접 경험이었다.
더욱이 비릿한 냄새가 확대된 삼겹살의 이미지처럼
수십 배 과장되어 내 후각을 자극할 듯 한 연이은 상상은 현기증을 일으킬 듯 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시각적인 내용을 담지하는 그릇인 형식적인 측면이 눈에 들어왔다.
작가의 기존 작업들이 대부분 벽면에 디스플레이 된 평면작업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작업의 특성은,
전시장 바닥에 전체 면적을 뒤덮는 방식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다.
대리석판은 바닥재나 벽면의 마감재로 활용되는 건축 자재의 특성이 있는데,
대리석과 삼겹살의 이미지가 서로 중첩되어,
바닥에 타일처럼 깔리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미술적 문맥상으로 평면작업이기 보단, 입체물의 작업과 연관성이 가깝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특정 전시장 바닥을 빼곡히 채우는 방식은,
디스플레이라고 보기보단, 장소 특정성이 반영된 설치 미술의 방법이다.
그런데, 설치 미술은, 특정 공간에서만 미술 작품화되는
정체성(한계성/아이덴티티)을 가지는 일면 그 특정 장소를 떠나면
그 생명력이 다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작품이란 것이, 감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은밀하게 상징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닌 투자대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작품의 대표적인 특성이 보존성, 내구성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상징가치나 교환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대상으로 교환가치가 결여되지 않거나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
평면 작업들은 밑칠을 하고 우수한 수지/바인더가 함유된 물감을 사용하며,
완결된 작품도 액자라는 보호 장치로 마무리한다.
또한 입체물의 경우 물리적으로 변성 가능성이 적은 견고한 재료를 활용해 제작하고,
좌대라는 보호 장치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미술작품은 물리적인 변성 가능성을 차단하는 여러 장치들을 통하여
교환 가치라는 도구적인 측면의 내구성을 보존시킨다.
대리석과 삼겹살이 오버랩 된 설치 작업은,
감상 대상으로 벽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전시장의 일정 공간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바닥 전체에 설치되어,
그 작품 위를 감상자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감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된 작품이 훼손의 방지 목적의
암묵적인 거리를 유지한 체 감상하고 다른 감상자와 소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과 직접 접촉한 상태에서 그 위를 거닐며 소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전시 작품 자체가 작업에 대한 소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수한 광장이라는 공간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은 일정한 문화적인 코드와
작가의 독자적 문법이 어우러진 직조물과 닮은 측면이 있다.
상투적인 비유법을 적용하면 문화적 코드라는 씨줄과
독자적인 문법이라는 날줄로 엮어진 직조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짜여 진 생천에 감상자들의 해석 가능성의 관심이
덧그려져 완성되는 것이 작품이라 생각해 본다.
동양화에서 안개나 구름을 직접 그리지 않고
그 주변을 그림으로써 안개와 구름을 대신하는 여백이나,
글자가 채워지지 않은 만화의 뭉게구름 같은 말풍선처럼
감상자와 독자의 화룡점정을 기다리는 그림과 닮았다고 할까?
만일 설치된 작업의 코팅면의 내구성이 완벽하지 않아서,
감상자들의 발자취, 흔적들이 표면에 일정한 스크래치를 만들고,
그러한 스크래치가 작품을 완성시킨다면 어떨까?
스크래치가 상처나 훼손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의도되지 않는 잠재적인 터치이며,
‘잠재된 터치’의 작가인 감상자들의 신체 접촉에 의한 흔적들이
어울려 완결되는 드로잉. 즉, 설치작업이
인터랙티브한 드로잉을 만들기 위한 과정 차원의 전시로 계획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전시장의 바닥에 설치된 작업이 감상자들의 접촉, 만남으로 완성되고,
이렇게 완결된 드로잉이 평면 작업으로 벽면에 다시 디스플레이 된다면,
작가의 작업 문맥상 모티브인 개별적 이미지들의 만남이,
작가의 작업과 감상자들이 만나는 광장에서 (또는 잠재적 감상자와 잠재적 작가의 만남)
완성되어, 작품이 완성되는 개념도 확장시키는 셈이고,
미술사적 맥락에서 특정 장소에서만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설치 미술의 자기 한계성도 극복하는 실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그림者)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3-09 15:48:13 board에서 이동 됨]
| Up | 714 | [빔] faint memory (2009. 12. 14.- 27.) … | 2010.02.16 |
| Down | 703 | 전시(문연욱展) 시작합니다. | 2009.11.20 |